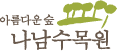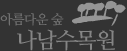| 민영빈 선생, 그리고 YBM | |
|---|---|
| 작성일 : 18.05.16 조회수 : 1227 | |
|
민영빈 선생, 그리고 YBM 한 어른의 죽음은 거대한 도서관 하나가 땅에 묻히는 것과 같다. 한평생을 실천한 신념과 사회적 체험과 지혜까지 사라진다.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 공동체를 유별나게 배려한 사람일수록 존재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상징이 되는 사람이다. 유한한 인간조건이지만 그런 분일수록 벌써 안타깝고 그리울 뿐이다. 시사영어사(時事英語社) 민영빈(閔泳斌) 창업주께서 향년 88세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 말년의 병석을 위문도 못한 죄를 고해야 하는데 꽃에 둘러싸인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계신다. 거인(巨人)의 미소이다. 질풍노도의 현대사에서 ‘영어를 경영한’ 올곧은 어른이시다. 하얀 국화꽃 밑에서 큰절을 올린다. 큰일 이루셨습니다, 편히 가십시오의 인사말도 눈물에 덮인다. 그리운 것은 그리워하며 울고 싶은데 칠십 주변의 눈물은 통곡도 어려운가 보다.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일 때마다 무소의 뿔처럼 옹골차게 가까운 미래를 헤쳐나간 선생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큰바위 얼굴이었다. 출판을 직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른을 뵙지도 못했을 것이다. 문예출판 전병석 선배에 이끌려 인사를 올린 지 벌써 40년이다. 촌티 나는 후배에게 글로벌한 젠틀맨의 품격을 배워주었던 대선배의 정이 남달랐다. 인사동 한정식집이나 일류호텔 바 출입 예절이나 옷매무새 단속까지 소소한 것을 일러주는 배려도 생각난다. 칠순을 기념한 선생의 회고록 《영어강국 KOREA를 키운 3·8 따라지》를 읽은 감동을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셨다. ‘3·8 따라지’는 해방 후 6·25 전쟁 전까지 자유를 찾아 월남한 5백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을 말한다. ‘3·8 따라지’라는 자조(自嘲)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붙인 것을 보아도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이다. 목숨만 부지했지 고향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빈털터리 신세였다.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처럼, 조그마한 주머니로 감싸려 해도 천성이 곧은 송곳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선생은 출판의 보자기 정도로는 감쌀 수 없는 큰 이상을 묵묵히 실천한 대인(大人)이셨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대학영자신문 〈Granite Tower〉은 1954년 선생이 영어공부에 대한 집념으로 창간한 출사표였다. 같은 피란민이자 평생의 도반(道伴)이 된 신일철 교수가 편집장인 고대신문의 자매지였다. 대학친구 민재식 씨까지 출판사에 합류한 위대한 우정은 평생을 간다. 훌륭한 동반자를 품을 만한 선생의 넉넉한 그릇의 품격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별세로 10년간 몸담았던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 기자· 논설위원직을 팽개치고 본격적으로 시사영어사를 맡는다. 월간 〈시사영어연구〉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었다. 생동하는 글로벌 감각을 터득할 수 있는 재야(在野)의 고급영어 교과서였다. 그리고 〈English 900〉 회화 테이프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디오 영어시대를 열고 영어회화 교육의 혁명을 일으켰다. 영문법 주변만을 맴돌던 벙어리 같은 제도교육이 민간출판에 의해 눈을 뜨고 말문을 열게 되었다. 수출만이 살 길이었던 1970년대에 이 영어회화 테이프와 함께 《상업무역 실무영어대전》, 《시사엘리트 영한사전》은 해외시장을 개척한 ‘수출전사’에게 미사일 같은 신병기였다. 지금 세계무역 10대국에 오른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이민이나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다음의 수혜자였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의병(義兵)의 사회에 살았다. 공교육이 흉내 낼 수 없는 살아있는 영어교육은 선생의 치열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이루어낸 의병정신의 총화였다. 그때 우리들은 종로2가의 YBM영어학원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이제는 전국 대도시에 이 학원이 포진하고 있다. 선생의 영어교육의 집념은 경기 판교와 제주에 외국인 중·고등학교의 창설로 대미를 장식한다. 1990년에는 선생의 필생의 꿈인 영자일간지 〈코리아 데일리〉를 창간하여 고생하기도 한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선 선생의 낙관적인 창조정신은 통속한 시대를 조금 앞서기도 했다. 선생은 자신의 이름 YBM을 회사이름으로 당당하게 내세웠다. 전쟁 같은 시장 속에서도 출판을 통한 문화창달을 이루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창의문(倡義文)이다. 한국 영어교육 의병장(義兵將)으로서의 YBM 깃발은 훌륭하게 키우신 아들 민선식 하버드대학 박사가 이어받아 종로2가의 본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YBM영어학원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선생은 고향 해주에 가까운 동두천 선영에 영어강국을 이룬 거인의 몸을 눕혔다. 평안하소서. 이 글의 일부는 2018년 2월 22일 〈한국일보〉의 '삶과 문화' 칼럼에 기고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휘청거리는 봄날에 ― 조용중 대기자를 기리며 |
| 다음글 | 시집 장가가는 날 |
|
|